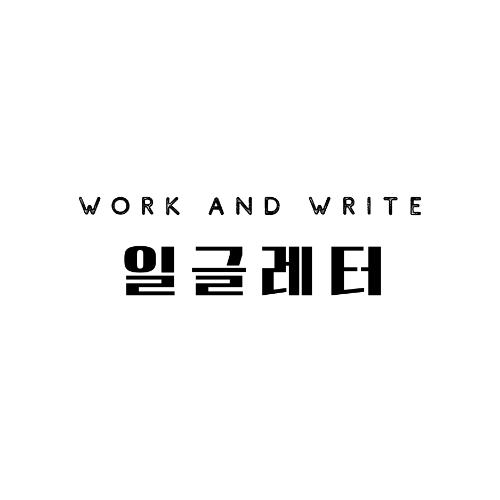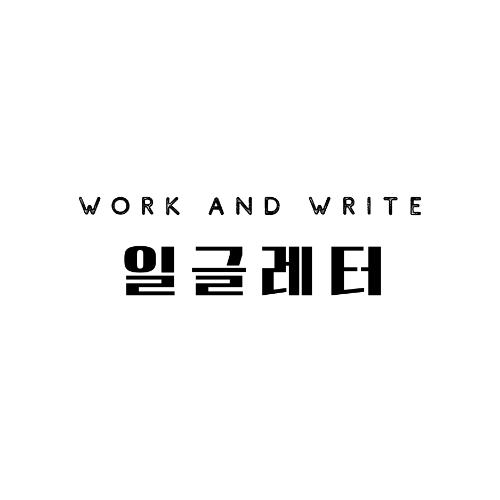이 짧은 영상 하나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첫째, 카메라에 비치는 제 얼굴에 관대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못 생기게 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보정하다 보면 결국 쓸 만한 영상 소스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편집을 하다가 '이럴 거면 그냥 말자'하고 그만둔 순간도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 영상 속에서 호탕하게 웃는 제 얼굴이 참 보기 좋았어요. 이런 순간을 그저 못 생겨 보인다고 기록하지 않으면 후회가 될 것 같았죠. 못난 자신이라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일이 기록이니까, 못 생기게 나오는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부담감을 덜어야 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거나 혹은 지인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늘 귀찮음과 싸워야 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촬영을 해야 하기도 했고, 이 짧은 영상을 편집하는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기록은 한 번 '반짝' 하고 그만둘 요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찮음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저는 영상 기록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규칙을 세웠고, 편집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모두 완료한다'와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무조건 편집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셋째,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릴스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이었다가 직접 릴스를 만드는 생산자의 입장이 되니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앞부분에 후킹 문구를 써보기도 하고, 최신 유행하는 음악을 넣어보기도 하며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학습 차원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에 과하게 연연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기록의 본질은 내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반응이 터질 만한 소재만 다룬다면 주객전도가 되어버리겠죠.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 나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씩, 부담 없이 기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이미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첫걸음이 되어줄 테니까요." - 리니, <기록이라는 세계> 중에서
책 <기록이라는 세계>를 쓴 리니 작가님의 말처럼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 내가 즐거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과하게 의식하면 결국 나다움은 사라지고, 스스로도 즐겁지 않으니 기록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수와 상관없이 제가 찍고 싶은 것만 찍고,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만 업로드합니다.
"그걸 누가 봐?"
저희 엄마가 제 영상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요. 맞아요, 아무도 안 볼 영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송은이 씨의 쪽잠 사진도 처음엔 그저 김숙 씨 휴대폰에 저장된 웃기는 사진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이 모여 30년 뒤 1,200명이 관람할 전시회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김숙 씨의 꾸준함과 송은이 씨에 대한 애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애정으로 꾸준히 모은 영상 기록들이 먼훗날 '유수진'이라는 한 편의 영화로 완성될지 누가 알까요? |